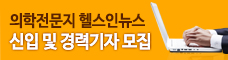FDA Type C 미팅은 개발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례적 회의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규제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임상 및 허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큐라클은 CU06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적응증으로 임상2b상을 진행하는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기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규제 전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FDA의 최근 개발 기준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미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큐라클에 따르면, FDA는 CU06의 개발과 관련해 큐라클이 지난 수개월 간 준비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FDA는 후속 임상(임상2b상 및 3상)에서 회사 측이 예상했던 대로 CU06의 치료 효과를 최대교정시력(BCVA)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했으며, 황반중심두께(CST)와 같은 부종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후속 임상은 시력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U06은 앞선 임상2a상에서 경구용 치료제 중 최초로 시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시작부터 투약 3개월 차까지 나타난 시력 개선 효과는 안구 내 주사제(Anti-VEGF)의 First-in-Class 신약인 루센티스(Ranibizumab)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Anti-VEGF의 12개월 실사용 데이터와도 비슷한 효능을 나타냈다.
CU06이 타깃하는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은 당뇨병성 황반부종과 습성 황반변성을 합쳐 2031년 약 4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허가받은 약물은 단 4종류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주사제다.
큐라클 관계자는 “주사제 임상에서도 시력 개선이 핵심 평가지표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치료제인 CU06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미팅에서 FDA가 그동안 회사의 입장과 일관되게 시력 개선이 핵심 지표임을 확인해 줬고, 임상2b상과 임상3상의 1차 및 2차 핵심 지표를 모두 시력 개선과 관련된 지표로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CU06은 임상2a상에서 우수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인 만큼, 이번 FDA 권고를 바탕으로 후속 임상을 더욱 자신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 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CU06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기술이전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미팅에서 FDA와 후속 임상 디자인과 관련해 위약(Placebo) 대비 우월성 입증 임상에 대해 논의했는데, Anti-VEGF와의 직접 비교(Head-to-Head) 임상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최종 임상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기술이전 활동을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 프로토콜을 확정하고, FDA와 협의를 거쳐 임상2b상 IND(임상시험계획)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큐라클 관계자는 CU06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에게 시력 측정이 불가능해 해부학적 변화만을 근거로 임상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시력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간 많은 경구용 치료제들이 부종을 개선하는 해부학적 변화를 보였으나 시력을 개선하지 못해 실패한 반면, CU06은 이미 임상2a상에서 시력 개선 효과를 입증했고, 최근 연구를 통해 시신경 세포 보호 작용도 규명한 만큼 성공적인 임상 연구와 기술이전은 물론 상용화 이후에도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주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