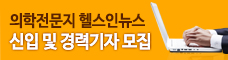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이다. 당뇨병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당뇨병은 관상동맥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염증 및 콜레스테롤이 잘 쌓이게 해 불안정한 죽상경화반을 증가시킨다. 이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환자는 관상동맥질환 발생 빈도가 높아 스텐트 시술(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PCI)을 많이 시행하지만, 시술 후에도 혈전증 및 재협착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제 및 콜레스테롤 조절제를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치료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 허혈성 사건의 재발율이 높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 방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동맥 질환·혈전은 ‘혈소판 활성도’에 의해서, 정맥 질환·혈전은 ‘응고 강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도 차이는 있어도 심혈관계 질환에서 혈전 발생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로, 대규모 임상연구인 COMPASS 연구에서는 당뇨 등의 고위험 위험인자를 가진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 단독 사용보다 항응고제인 리바록사반을 아스피린과 병용 사용하는 경우, 임상 사건의 재발을 2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가 부족한 이전 임상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정영훈 교수 연구팀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2501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진행했다(G-NUH 레지스트리). 전체 환자 중 970명(38.8%)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모든 환자에서 ‘당화 혈색소(HbA1c)’ 및 ‘응고 강도(혈전탄성도검사[TEG]에서 확인된 MA 수치)’가 측정됐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의 ‘응고 강도’가 유의하게 증가돼 있으며, ‘응고 강도’는 당뇨병의 조절 정도(HbA1c)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스텐트 시술 후 환자의 예후에 당뇨의 불량한 관리(당화혈색소 7.0 이상) 및 ‘응고 강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4년 동안의 추적 관찰에서 당뇨병과 높은 ‘응고 강도’를 동시에 가진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보다 심뇌혈관 사건의 재발이 2.5배나 더 증가했다. 또한, 당뇨병의 조절 정도가 불량하고(당화혈색소 7.0 이상) 혈액의 응고 강도가 높으면, 심뇌혈관 사건의 재발이 2.2배 증가했다. 특히, 이런 차이는 심혈관계 사망에서 더욱 두드러져, 각각 3.4배 및 2.7배의 위험도 증가를 보였다.
당뇨병과 위중한 출혈 발생 위험도의 관련성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낮은 ‘응고 강도’를 가진 경우에서만, 당뇨병 또는 불량한 당뇨 조절(당화혈색소 7.0 이상)을 가질 경우 출혈 위험이 3.4~4배까지 증가됨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팀은 당뇨병(또는 당뇨 조절 정도) 및 혈액의 ‘응고 강도’가 스텐트 시술 후 허혈성 및 출혈성 심뇌혈관 사건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당뇨병 환자의 예후 개선에 적극적인 당뇨 조절과 함께 맞춤형 항혈전제 사용의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를 진행한 조성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스텐트 시술 이후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심뇌혈관 사건의 재발이 빈번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며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서 예후 개선을 위해 획일적인 항혈소판제 사용의 한계성을 규명한 기념비적인 자료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심장학회지: 심혈관중재술(JAC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피인용 지수 11.7) 2025년 2월호에 게재됐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